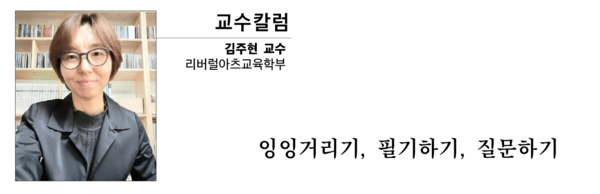
일찍 개화한 매화에 벌이 찾아왔다. 희미한 매화향을 용케도 맡고 날아온 벌들은 어떻게 이 날씨에 꽃이 핀 것을 알까. 냄새와 색깔로 ‘꽃으로 가는 길’을 정한다는데, 과학적 정보야 어떻든 벌집은커녕 새집도 안 보이는 하늘을 가르며, 단번에 꽃을 향한 ‘최적 경로’를 찾아낸 생태가 신비하다. 물론 이 ‘단번’은 수천 년 군집 생활이 성취한 집단지성의 결과일 것이다. 레이첼 카슨은 생태계가 붕괴돼 이렇게 영민한 벌과 벌새가 오지 않는 미래의 봄날을 경고한 바 있다. 겨우살이를 끝내고 노동에 분주한 벌을 보며 다시 『침묵의 봄』을 들었다가 덮는다. 생각해보면 어떻든 매화나 벌은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있는 힘을 다해 봄의 기운에 반응하지 않았나. 가끔 가을 한때를 초봄으로 착각하는 개나리와 비슷한 이치다. 점점 따뜻해지는 기온 탓이지 정직하게 반응하는 생물을 나무랄 수는 없다.
봄학기는 여러모로 일찍 나온 벌을 닮았다. 잎 없는 가지에 희고 노란 자잘한 꽃을 단 나무 주변을 잉잉거리고, 느닷없이 내린 비에 어리둥절 날개를 파닥거리는 학생들이 있는 봄이 또 온 것이다. 작년 가을 이미 ‘프레시’하지 않았던 곳에 다시 벌을 닮은 신입생들이 왔으니 최소 5월까지는 캠퍼스가 적적하지 않겠다. 잉잉거림이 잦아들면 때맞춰 신록이 무섭게 짙어지니 1학기는 신입생과 신록만으로 눈이 호강한다. 남쪽의 봄이 이르다고, 지방대학에 반갑지 않은 벚꽃이 피었다고, 잉잉거리는 자들이 만개한 꽃을 즐기지 않으랴. 세상사에 점점 무심해지는 노땅들에겐 그 옆을 지나치며 재재한 수다에 슬핏 웃게 되는 이상으로 좋은 때도 드물다.
바라자면 강의시간에 좀 그렇게 재재거려주면 좋겠다. 흥이 절로 나는 만개한 꽃나무 아래가 못되더라도 가끔 질문해주면 좋겠다. 중간고사를 못 봤는데요... 오늘 수업하나요? 늦었지만 리포트 좀 받아주세요, 같은 ‘민원성’ 질문 말고,(이런 질문은 언제나 넘치니까) 캠퍼스의 봄을 기대하며 품었던 이런저런 바람을 나누고 악의 없는 농담을 던지며 친밀하게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후유증이리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이런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활동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적지 않은 혜택을 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오래다. 우리 대학도 ‘인제 스타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에 학생들은 상금이나 장학금이 걸린 온갖 참여자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강의시간은 왜 조용한가. 강의에 집중해서 생겨나는 뜨거운 고요가 아니다. 봄의 끝머리만 되면 되도록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고요와 침묵이 서서히 퍼지고 교수의 독백이 늘어간다. 액션 러닝이나 PBL수업은 조금 낫지만, 이른바 토론 중심 수업을 한다고 매시간 사전에 교수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오는 블렌디드 수업도 다르지 않다. 안 듣고 온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 내용을 거듭 설명하다 보면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토론이 강의로 대체되기도 순식간이다.
대세를 역행하는 방법일지 몰라도 한 2년 한 강의에서 그 흔한 슬라이드도 잘 쓰지 않고 오직 설명하고 판서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써 보았다. 미리 배포한 강의안을 가지고 눈을 맞춰 속도와 호흡을 조절하는 이 고전적인 방법이 의외로 꽤 효과적이다. 기기 보조에 익숙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쉬는 시간이면 곧잘 손글씨로 필기한 내용을 들고 온다. 교수가 편해서가 아니다. 말과 글로 이루어진 설명은 정리된 슬라이드보다 상대적으로 허점이 많아 슬라이드를 볼 때보다 훨씬 집중해야 한다. 게다가 미안하게도 나는 달필이 아니니 부득이 잉잉거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갓 들어온 벌들이 동시에 불만을 제기했으면 어쩌랴, 정제된 꿀을 준비했을 터이나 다행히 작년의 ‘벌님’들은 제법 스스로의 날갯짓에 만족했다. 어쩌면 교수란 강의실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일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