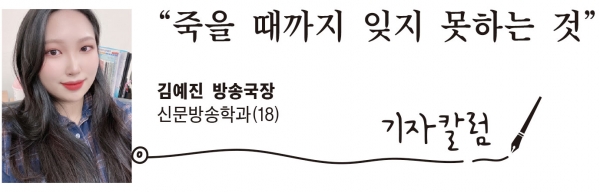
학생기자 2년차, 처음으로 팩트를 최우선으로, 무엇보다 정확하게 담아야 하는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수습기자 때부터 이런 일을 다루는 모습을 그려왔지만 막상 닥치니 막막했다. 신문방송학과 학도로서, 인제미디어센터 학생 기자로서 언론 윤리와 기자의 의무에 대한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은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는 ‘어떻게’의 질문이 나를 옥죄어 왔다.
어쩌면 겁이 난 걸지도 모른다. 제보자가 미디어센터에 준 신뢰와 학생들의 알 권리, 일이 잘못됐을 경우 나의 신변에 대한 우려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방송국장으로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임했나, 동료 기자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겁먹은 건 나였구나, 부끄러웠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직 신문사 기자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다행히 내 역할에 대한 질타가 아닌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날 문자를 남기자 마자 전화를 해주신 선배님도 조언과 내가 참고하면 좋을 여러 기사들을 보내주셨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건을 마주했다.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내 역할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자 주저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몇 번에 걸친 팩트 체크와 9시간 넘게 진행된 취재와 미팅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중간중간 쥐도 났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여러가지 고민으로 5일 동안 밤잠을 설치게 한 뉴스가 업로드 되었다. 5일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잤기에 뉴스를 업로드하고 바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오랜만에 맛보는 단잠에 취해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수업을 들으러 갔다. 쉬는 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에 올린 뉴스를 보고 도움을 주셨던 선배들과, 제보자의 감사인사 연락이 와있었다.
그제서야 하늘을 똑바로 쳐다봤다. 5일만에 제대로 본 하늘은 참 파랬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지만 내 자리의 책임과 소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느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족이었다. 거기에 보람이 함께하니 이것 만한 쾌감이 어디 있을까. 그래,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후배 기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하나 더 늘었다. 나는 비록 나의 신변과 언론의 소임을 저울질했던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지만, 후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만을 다루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취재원의 의견을 차별과 가감없이 담는다면 문제가 될 사안은 거의 없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 언론이 위기라는 말은 내가 입학 할 때도 있었고,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 그 말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의무와 소임을 다 한다면, 언젠가는 대학 언론이 위기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흔히 언론의 이상적인 모습을 감시견에 빗대곤 하는데, 사회의 축약형인 대학에서 언론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누구를 위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너는 학생 기자인가, 기자 학생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