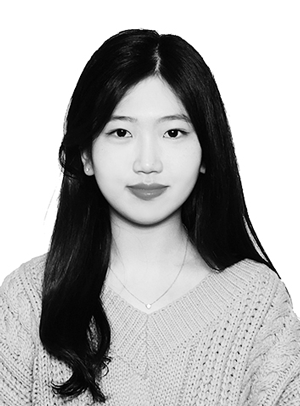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생 기자 2년 차를 마무리하려 한다. 가끔 한국학부 장수정보다 취재팀장 장수정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약간 소름 돋기도 한다.
지난해 4월 나와 동기 2명이 본교 학보사에 들어오기 전까진 학생 기자 4명이 전부였다. 2015년도에는 선배 셋이서 12면의 신문을 만들었다. 2주에 한 사람당 약 40매 정도의 글을 쓰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 학기 신문발행 6번, 12주 그러니까 약 3개월 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학보사에 쏟아부어야 하고. 너무 지쳐 그만두고 싶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학보사 상황에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나 대신 고생할 학보사 가족들이 눈에 훤해 참고 꾸역꾸역 기사를 쓰다 보면 어느덧 마감 주가 되고 결국 신문은 나온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신문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많이 읽히지 않는다. 종이신문의 구독자가 줄어들면서 이를 만드는 학생 기자 역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몇십 년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 신문의 오랜 역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보사의 퇴보는 학생 기자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역시 처음엔 기자라는 꿈을 갖고 입학하자마자 학보사에 들어왔다. 수습 기자 한 학기, 정기자 한 학기 그리고 취재팀장 1년 총 2년이란 기간을 학보사에서 보냈다. 그런데 지금의 내게 남은 것은 현실과 타협한 나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나는 이곳에서 기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이런 것도 못 버티면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래?’라는 말로 나를 다그치는 법을 익혔다. 압박하는 노동과 끝없는 감정 소모는 결국 나를 신문을 위한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학보사에 어렵고 힘듦만 있는 건 아니다. 넓은 캠퍼스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건 외로운 타지생활을 버틸 수 있게 했고, 함께 밤을 새우고 같이 눈을 뜨는 가족 같은 사람들도 얻었다. 그러나 모두가 지쳐 나가떨어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학보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미디어는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미디어의 중심에는 바로 신문이 있다. 오늘날의 대학신문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해있다. 지금보다 덜 힘들고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학보사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 측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아마 내년부터 8면으로 줄어드는 지면이 ‘변화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학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닌 대학의 흐름을 만들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인제대 신문사가 그런 학보사가 되기를 한 명의 구성원이자 구독자로서 바라본다.
